주일영상설교
 >
>
- 예배 >
- 주일영상설교
|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 이성범목사 | 2020-03-29 | |||
|
|||||
[성경본문] 히브리서11:13-16절 개역개정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1만 명에 가깝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은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각종 모임의 취소는 물론 교회의 신성한 예배마저 온라인으로 드러거나 가정예배로 축소하여 드리도록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정체성 또한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예배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배 형식의 변화는 있었어도, 예배는 언제나 교회의 근간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항구의 등대를 바라보아야 하듯 예배 공동체성에 대한 신학적 고민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송과 대중매체, SNS 등이 세상의 방법을 강요하고 잘못된 특정한 상황을 진리인 것처럼 일반화시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집요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물리적이나 정치적 포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월터 브루그만이 이미 지적했듯이 문화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포로기입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기독교 가치는 가볍게 또는 경멸적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고민해야 할 쟁점은 교회를 향하여 매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문명의 이데올로기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압력 사이를 지혜롭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때로는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세 인물, 즉 요셉, 에스더, 다니엘은 오늘의 살아갈 과감함과 모범을 보여줍니다. 1.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도화된 세상 정권과 잘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세상 주권자가 규정하는 현실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습니다. 2. 에스더의 이야기는 세상 정권을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능가하여, 자신을 위한 명예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백성의 복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 다니엘의 이야기는 뜻하지 않게 이방 왕국을 섬기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제국 바깥의 하나님에게 내린 덕분에 오히려 이방 왕국을 향하여 당당한 권세를 행세할 수 있었던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리처드 니버가 소개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모델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신자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혜롭고도 위험스러운 교섭의 과정을 밟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타협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고, 반면 타협주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까탈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의 위협 앞에 동화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절대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섬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과 현실의 압력 사이에서 교섭의 과정을 분명하게 해명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신자와 교회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평안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세상 여러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적 포로기 이스라엘의 소망은 귀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포로기 시대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막연한 현실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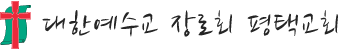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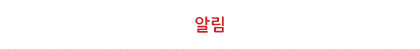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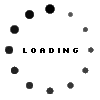
댓글 0